운명처럼 다가 온 평택농악
강산이 변했는데 아직도 신참, 평택농악 이수자 된 것은 큰 영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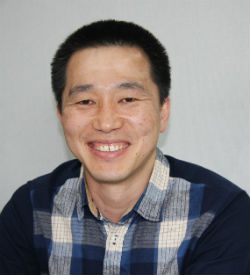
80~90년대 대학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흥을 돋게 했던 풍물패는 운동권 동아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 당시 풍물패는 학내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로 학생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다. 그곳에서 처음 장고를 잡고 꽹과리를 손에 쥐었던 평택농악보존회 문상보 사무국장은 94년도에 평택농악을 처음 접했다.
그 후, 풍물패 때 상쇠를 맡아 농악의 매력에 빠지면서 평생을 농악에 매진하리라고 작정했다. 대학 졸업 후 광주와 청주 풍물패를 거쳐 평택에 정착하기까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그는 2005년 평택농악보존회 상시 공연인력 채용과정을 통해 평택에 정착했다. 평택농악이 그의 운명이 된 순간이었다. 당시 뽑힌 열 명은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평택농악보존회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던 때였다. 조례가 제정된 지금도 상근 공연자들은 전승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원받지만 급여개념은 아니다. 게다가 4대 보험 적용이 안 될 정도로 회원 복지는 여전히 기대수준 이하이다. 이처럼 장래 전망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안정적이라 할 수 없는 평택농악을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매달릴 수 있는 건 농악이 주는 흥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은 장고를 잡고 있지만, 꽹과리를 잡고 대학 풍물패를 지휘하던 상쇠 시절부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명에 어깨를 들썩이곤 했단다. 사뿐사뿐 까치걸음으로 춤을 추게 했던 ‘소리’가 좋았을 뿐이라는 문 국장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일지 모른다. 다행인 것은 입단 다음해에 평택농악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상임단원이 된 덕택에 공연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농악지원조례만큼은 평택시가 선구적이다”며 평택농악을 자랑하는 문 국장은 조례 제정 덕택에 공연 볼거리가 다양해졌고, 시민 요구를 수용하여 창작공연 현대화작업이나 전승교육체계 정착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단원들의 생활도 일반직업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생활적인 면에서 안정된 것은 분명하단다. 많지 않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평택농악이 문화재라는 자부심은 단원들을 버티게 해 준다.
“지지자(知之者)는 불여호지자(不如好之者)요, 호지자(好之者)는 불여락지자(不如樂之者)니라.” 논어 옹야편의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은 문 국장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93년 풍물패에 들어갔던 때로부터 해도 20년을 갓 넘었으니 아직은 신참이죠”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햇수로 23년을 하고도 그가 아직까지 신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평택농악 전승시스템에 있다. 평택농악은 인간문화재인 김용래 보유자 밑으로 다섯 명의 전수교육조교, 그 밑으로 열다섯 명의 이수자와 아홉 명의 전수생 외에도 일반회원·준회원·특별회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는 엄격한 전승시스템 속에서 문 국장은 3년 이상 전수생 생활을 거쳐야 되는 이수자 중에서도 경륜이 아주 짧은 편에 속한다. 이수자가 되면 문화재청 전승체계에 등록된다.
평택농악이 운명처럼 다가왔다는 문 국장은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를 꿈꾸고 있을까?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이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정통성이나 명분 면에서 보존회가 튼튼해진다. 이수자 이상은 꿈도 안 꾼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지 않은 이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문 국장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어떻게 해야 보존회가 튼튼해질지 알고 있었다. “평택농악보존회 구성원들은 자리 욕심보다는 공연에 참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문 국장은 농악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답게 작년 공연 때 아킬레스건을 다쳤던 아픈 기억에도 여전히 공연 연습할 시간이 부족함을 호소한다. 사무국장으로 행정과 공연을 병행하다보면 늘 시간에 쫒기기 마련이다. 그래도 결국은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 국장은 참 낙천적이다. 오는 5월 평택농악 무형문화재 지정 30주년을 기념하는 정기 발표회를 평택시민이 함께 즐기는 잔치로 만들고 싶다는 문 국장에 평택농악은 삶, 그 자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