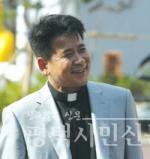
불교 신자도, 유교 신자도, 그리스도교 신자도 모두 초월을 꿈꾼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더’ 행복해지길 원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작 초월은 단숨에 이뤄지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초월했으면 좋겠는데, 행복이 하루아침에 성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초월(transcendence)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더’(a little more) 혹은 ‘그만큼 더’(all the more)다. 초월은 단번에 완전한 상태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이것이 초월이다.
병을 앓을 때, 약을 먹으면 단번에 낫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병에 차도가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초월이다. 육체, 정신, 마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초월을 성취해야 한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록을 깨기 위해 달리는 육상선수, 또 다른 형태의 예술 양식을 만들어내려는 음악가나 무용가, 지구 밖 우주 공간을 탐험하는 인류, 미세한 세포들과 생명체의 조직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학계가 그렇다.
육상선수가 하루아침에 세계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하루하루의 땀이 쌓일 때 기록갱신이 가능하다. 천체 물리학자가 소행성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선 수많은 밤들이 지나야 한다. 인간은 이렇게 매일 조금씩 본질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초월하려 하고, 결과적으로 그 초월을 성취해 낼 때 가장 행복하다.
학교교육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이러한 초월성을 각인시키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첫걸음이다. 학생들이 초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공부해!’가 아니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초월의 성향을 개발해라”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을 깨닫게 되면 삶의 형태, 인생의 형태가 달라진다. 학교는 점수 따는 곳이 아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을 개발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초월성을 인식하는 학생은 작은 실패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키장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그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손발이 시려도 환하게 웃는다. 스키를 좀 더 잘 타기 위해선 무엇이라도 하려고 한다. 수없이 많이 넘어져도 웃는다.
‘좀 더 잘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초월성이고, 이 초월성을 깨닫게 하면, 인간은 행복해 질수 있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똑같다면 그것은 개구리의 삶이고, 다람쥐의 삶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속에선 행복을 느낄 수 없다.

